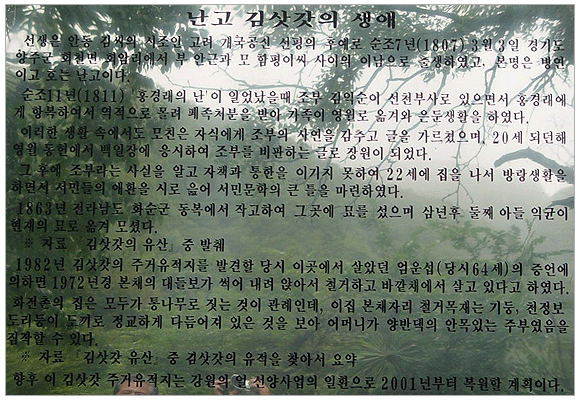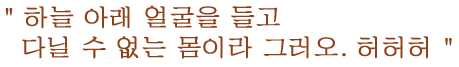|
蘭皐公 諱炳淵 (난고공 휘병연) 조선 후기 방랑시인으로 자는 성심(性深) 호 난고(蘭皐) 본관은 (신)안동(安東)이다. 신안동김씨(장동김씨:壯金) 12세서윤공(번)파 -15세휴암공(상준)의 9대손으로 속칭 김삿갓 혹은 김립(金笠)이라고도 부른다. 아버지는 김안근(金安根)이며 경기도 양주 명문 세도집안(장김)에서 출생하였다.
1811년(순조 11) 홍경래의 난 때 선천부사(宣川府使:선천방어사)로 있던 조부 김익순(金益淳)이 홍경래에게 항복하였기 때문에 연좌제의 의해 집안이 망하였다. 당시 6세였던 그는 하인 김성수(金聖洙)의 구원을 받아 형 병하(炳河)와 함께 황해도 곡산(谷山)으로 피신하여 숨어 지냈다. 후에 사면을 받고 과거에 응시하여 김익순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답을 적어 급제하였다. 그러나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벼슬을 버리고 20세 무렵부터 방랑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항상 큰 삿갓을 쓰고 다녀 김삿갓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전국을 방랑하면서 각지에 즉흥시를 남겼는데 그 시 중에는 권력자와 부자를 풍자하고 조롱한 것이 많아 민중시인으로도 불린다. 아들 익균(翼均)이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했으나 계속 방랑하다가 전라도 동복(同福:전남 화순)에서 객사하였다. 묘소는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노루목 태백산 기슭에 있으며, 1978년 그의 후손들이 광주 무등산에 시비를 세우고, 1987년에는 영월에 시비가 세워졌다. 작품으로 《김립시집(金笠詩集)》이 있다.
"너는 안동 김씨의 후손이다. 안동 김씨 중에서도 장동(壯洞)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세도가 당당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들을 장동김씨라고 불렀는데 너는 바로 장동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 ||
|
- 장원하던날 어머니가 - | ||
|
| ||
|
김삿갓이 다섯 살 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다. 조부 김익순은 높은 관직인 선천방어사(종3품)였다. 그는 어쩔수 없는 상황(새벽에 홍경래군이 갑자기 들이닥쳐 저항한번 해 볼 겨를없이 붙잡히게 됨)에 홍경래에게 항복하여 역적으로 몰려 폐족처분(멸족은 아님:당시 정권실세가 壯洞金氏이기때문에 처벌이 완화된것임)을 받아 숨어살아가고 있다가 역적의 집안으로 전락되어 멸족을 우려한 부친이 형과 함께 그를 곡산으로 보내 노비의 집에서 숨어살게 된 김삿갓은 여덟 살에 조정의 사면으로 집으로 돌아오나 그 가족들이 온전히 터잡고 살 곳이 없었다.
| ||
|
| ||
| ||
| ||
|
그는 조부를 규탄하는 명문으로 장원에 급제하나 할아버지를 팔아 입신양명 하려고 한 자신에 부끄러움을 느껴 글공부를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며 은둔 생활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백일장을 보기 전에는 그의 조부가 김익순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그는 신분의 상징인 갓 대신 삿갓을 쓰고, 먼길의 여행자의 피곤함을 벗하는 대나무 지팡이를 집고 평생 조선 팔도를 방랑한다. 태어날 때부터 높낮이가 결정된 답답한 조선시대의 권력자와 부자에 대한 조롱과 풍자는 개인의 꿈과 능력의 나래를 펴고자 노력했던 서생들과 부당하게 대우받고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시원한 한풀이가 되었다. 그를 모르는 조선백성이 없었다. 그의 시는 듣는이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 ||
|
| ||
|
| ||
|
| ||
|
현대에도 안동김씨 가문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영월군에서는 매년 김삿갓 문화제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 ||
|
| ||
|
| ||
|
김삿갓은 방랑의 시간들 속에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1863년 3월 25일, 57세의 나이로 전라도 화순군 동복면에서 객사를 하게 된다. 부친의 행방을 찾아헤매던 익균은 부친의 유골을 자기 집 가까운 영월로 이장을 해온다. | ||
|
| ||
|
| ||
|
우리 일행은 천신만고하여 마침내 와석리의 노루목 마을에 도착하였다. 마을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개울가 좌우편 언덕배기에 서너 채의 집이 쓸쓸하게 매달려 있을 뿐인 곳이었다. 박영국씨가 경사진 언덕배기 위로 달려 올라가더니, 화전 한 귀퉁이에 오직 하나뿐인 무덤을 가리켜 보이며 말했다. "이 무덤이 바로 김삿갓의 무덤입니다." 첫눈에 보아도 외롭기 짝없는 무덤이었다. 그 무덤 앞에는 높이가 두어 자 가량 되어보이는 묘비가 서 있는데 그 묘비에는 "蘭皐 金炳淵之墓" 라는 일곱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 ||
|
<소설가 정비석의 회고담에서> | ||
|
| ||
|
| ||
|
그에 관한 다른 의견들도 있다. 김삿갓의 살림이라곤 얼굴을 거의 가리다시피 하는 큰 삿갓, 개나리 봇짐 하나, 그리고 대나무 지팡이가 전부였다.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특이한 복장을 한 김삿갓에게 물었다. "어찌 그렇게 큰 삿갓을 쓰고 다니오? 불편하지 않소?" "하늘 아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몸이라 그러오. 허허허" 김삿갓은 할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었다. 바로 이때부터 그의 본명인 김병연으로 불려지지 않고 김삿갓이라고 된 것이다. 방랑 초기에는 지방 토호나 사대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름대로의 품위를 유지하나 세상 인심이 한결 같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 ||
|
| ||
|
| ||
|
그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고 서민들 속에 섞여서 날카로운 풍자로 상류 사회를 희롱하고 재치와 해학으로 서민의 애환을 읊으며 일생을 보낸다. 타고난 글 솜씨와 영리함으로 급제까지 했던 김삿갓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즉흥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산과 들 그리고 사람에 얽힌 그의 시는 한 수 한 수 철학이 깃들여져 있으며 풍자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세도가와 거만한 부자들의 허풍을 마음껏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의 시 속에는 당시 부당하게 대우받고 사는 가난한 백성들의 한풀이로서 충분했다. 때문에 김삿갓의 시는 가난한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나이 쉰 일곱, 전라도 땅에서 눈을 감음으로써 아웃사이더로 살아온 일생을 마감하고 아들 익균이 유해를 영월로 옮겨 장사를 지냈다. 영월 와석리에 그의 생가 터와 묘지가 있다. | ||
|
|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고균(휘 옥균)-백야(휘 좌진)-가계도 (0) | 2010.06.09 |
|---|---|
| [스크랩] 방랑시인 난고(김삿갓:휘 병연)선생 가계도 (0) | 2010.06.07 |
| [스크랩] 9대조 (진사공)할아버지 산소 (0) | 2010.02.04 |
| [스크랩] 나의 5대조부 副護軍(부호군)할아버지 (0) | 2010.02.02 |
| [스크랩] 나의 직계조상님들 (0) | 2010.01.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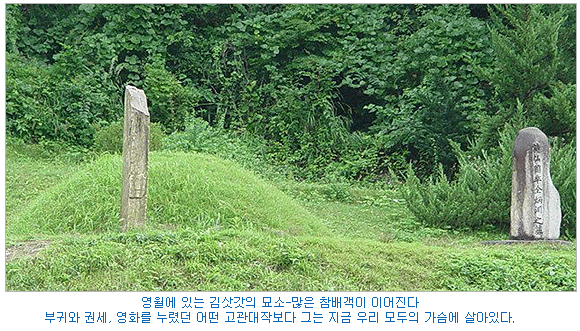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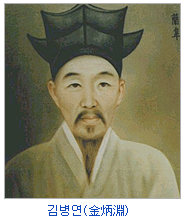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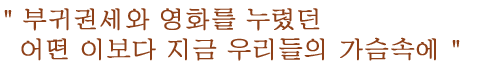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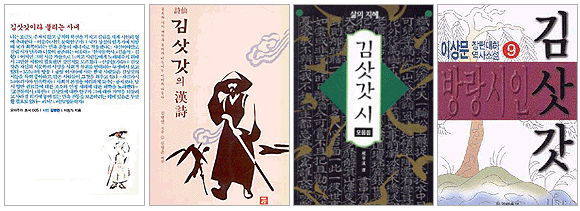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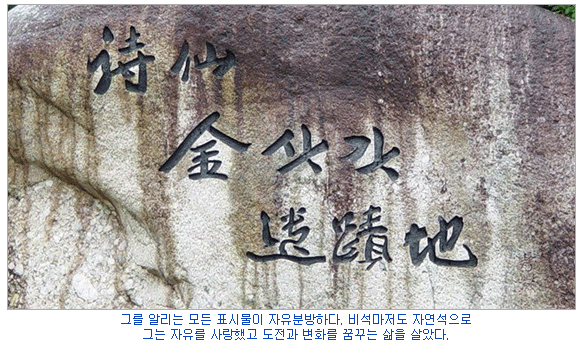
 작가 이문열은 그의 장편소설 {시인}에서 "김삿갓은 어려서부터 이미 조부의 역적행위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라는 것과, 그 때문에 선비로서의 자신의 출세길 또한 위태롭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탄하고 있었으며, 그 한을 백일장에서 글로 표현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 한동안은 서울의 권세가를 기웃거리며 조부의 행적을 극복하고 출세길을 꿈꾸었으나 현실의 한계를 깊이 절감하고 그제야 마침내 삿갓을 쓰고 전국을 떠돌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작가 이문열은 그의 장편소설 {시인}에서 "김삿갓은 어려서부터 이미 조부의 역적행위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라는 것과, 그 때문에 선비로서의 자신의 출세길 또한 위태롭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탄하고 있었으며, 그 한을 백일장에서 글로 표현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 한동안은 서울의 권세가를 기웃거리며 조부의 행적을 극복하고 출세길을 꿈꾸었으나 현실의 한계를 깊이 절감하고 그제야 마침내 삿갓을 쓰고 전국을 떠돌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